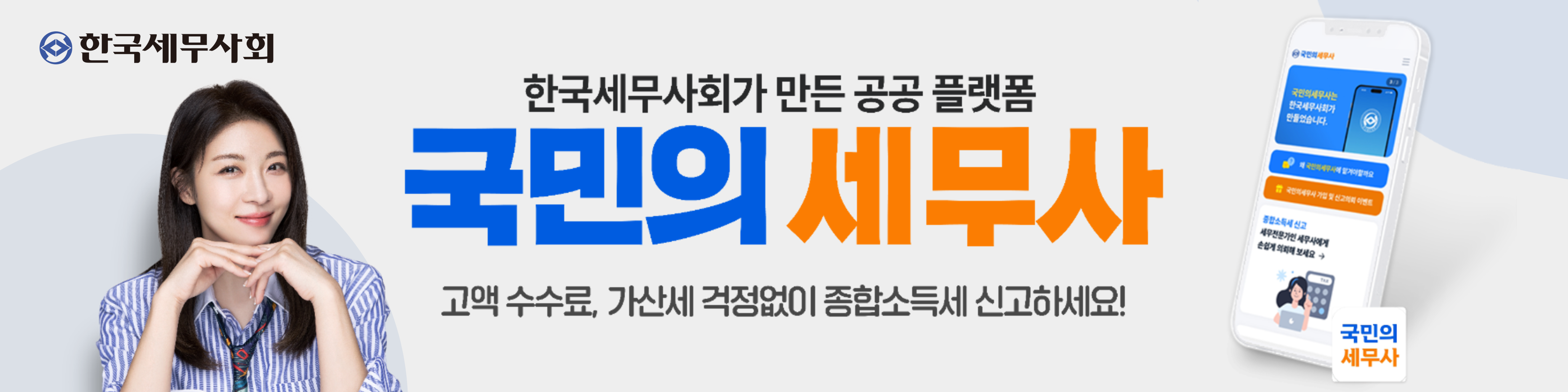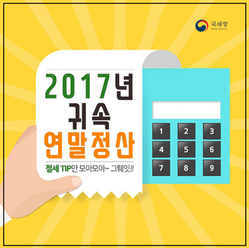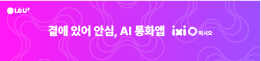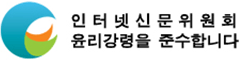불확실성과 기업경영의 방향 ,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1-09 09:33:05
 |
기업의 위험
1960년대 국내 100대 기업 중 1990년대까지 살아남은 곳은 10여개 회사에 불과하다. 범위를 좁혀 10대그룹만 보면 삼성과 LG뿐이다. 1970년대에 떠오른 율산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난, 기업주가 불법 외환거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라졌다. 1980년대 명성그룹은 기업주가 불법자금조달로 구속되면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거평그룹은 무리한 확장과 외환위기의 금융기관권의 자금회수로 무너졌고 뉴코아, 나산 등도 외환위기 이후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무너졌다. 2000년대 재계 서열 17
위였던 동양그룹의 회장이 2016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파산했다.
한때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바둑용어가 한국경제에서 통용되었다. 하지만 20세기말과 21세기
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대마필사(大馬必死)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좌초되는 대기업이 많다. 무리한 차입과 투자, 불법과 등으로 많은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대마불사나 대마필사라기보다 든든하고 견실한 말, 견마불사(堅馬不死)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무모함(risk)이다.
기업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살아남기는 더욱 어렵다. 여기에 기업 ‘리스크’라는 변수가 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1983년부터 2005년사이 22년 동안 S&P500의 최고 기업은 IBM, 엑손
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갔다. 포브스가 발표한 ‘2016년 세계 억만장자(10억 달러)’ 명단에 198명의 억만장자가 새로이 오르고 221명이 탈락했다.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리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첫째는 법률 ‘리스크’의 하나인 분식회계이다. 분식회계는 회계조작, 탈세, 횡령 등 불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이다. 둘째는 환경변화 ‘리스크’인 시장 침체이다. 명품 브랜드 ‘토리 버치’의 토리 버치(Tory Burch)의 재산은 10억 달러에서 2억달러로 80%가 줄었다. 중국 경제와 소비 위축, 반부패 정책으로 명품시장 침체가 가속화한 것이다.
셋째는 환경변화 ‘리스크’의 하나인 경쟁심화이다.짐 코크(Jim Koch) 보스턴비어 창업주는 경쟁심화로 그 주가가 2015년 40% 하락했다. 어떤 산업도 초과이윤이 나면 언젠가는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기업가들은 잊는다. 이를 보면 얼마나 ‘리스크’ 문제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경제위기를 겪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2017년에는 ‘10년 주기설’과 함께 또 다른 불확실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대로 심할 경우 1%대까지 가능하다는 위기설이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영실패의 주범‘AIDS’」라는 보고서에서, 경영 실패를 부르는 요인 4가지를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과욕(Avarice), 타성(Inertia), 착각(Delusion), 자아도취(Self-absorption)가 그것이다. 기업 위험을
부르는 원인을 잘 요약한 단어이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경영의 방향을 가늠해보아야 한다.
미래 리스크
미래 불확실
경제의 불확실성
그 옛날 소크라테스는 미래의 불학실성과 위험에 대하여 이렇게 간파했다.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in human affairs;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Socrates).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은 20세기 초에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시가 폭삭 무너진 것이다. 한 달 만에 당시 1800억 달러가 허공에 사라졌고, 1930년까지 미국에서 천 개가 훨씬 넘는 은행이 파산하고 2만 개가 훨씬 넘는 기업이 일거에 도산했다. 20세기 들어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99년 닷컴버블의 붕괴,2007년 주택시장 신용거품의 붕괴는 금융시장과 경제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2008년 금융시장 붕괴는 월가의 ‘천재’들이 그러한 실수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2009년 “미국 월가가 한 개의 수학 공식으로 붕괴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수학 공식 하나
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키운 불씨가 되었다는 기사이다. 그 수학공식은 2000년 데이비드 X. 리라
는 금융공학자가 발표한 ‘가우시안 코풀라 함수(Gaussian copula function)’이다. 이 함수 하나로
불확실성이 커서 거래가 힘들다던 주택담보 증권에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되자 엄청난 시장이 열렸다. 절정에 달했던 2006년 4조7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붕괴했고 금융위기가 찾아 왔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업의 불확실성
경제의 불확실성은 예측할 수 없는 기업 비즈니스모델의 대변동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대 초의 전 세계 기업가들은 기업의 가장 큰 위험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와 산업의 출현을 꼽았다.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서 예측하지 못한 경쟁자가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고 관련된 기업과 산업이 도태되고 소멸할 수도 있는 위험이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기존
호텔에 뜻밖의 경쟁자의 출현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 기업과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의 택시회사인 뉴욕 옐로캡과 샌프란시스코 옐로캡이 파산신청을 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들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어떤 산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할 수 없다.
산업의 불확실성
미국에서는 보통 10년마다 호황인 업종이 바뀌었다. 선두업종이 바뀌면 선두기업도 바뀐다.
S&P500지수 기업 중 가장 큰 순이익을 달성한 10대 기업과 산업은 거의 10년마다 달라졌다. 1950년대에는 자동차, 중공업, 화학 등이 호황이었고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등 자동차 기업과 엑슨모빌, 걸프오일 등 에너지기업들이 최고의 기업이었다. 1960년대에는 컴퓨터 산업이 호황이었고 IBM이 부각했고 20여 년 동안 IBM과 에너지기업들이 선두였다.
1980년대는 대규모 인수합병과 함께 소비재 회사 필립모리스와 나비스코가 두각을 나타냈다.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2000년대에 금융기업들의 시대였다.
일본도 이러한 산업 변동을 겪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 기업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여 섬유, 조선, 철강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집중하여 서구의 산업과 시장에 도전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시장 경쟁력은 하락하여 수익성이 떨어졌다. 일본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핵심영역 집중화전략으로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자 신축 생산시스템(flexible factory)을 도입하여 원가절감과 다품종생산(great variety in the market)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는 시간관리전략(time-based strategy)으로 미국기업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는 전략이 추구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장기적으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장수기업도 도산하고 있다. 전체 퇴출 기업 중 30년 이상된 장수기업이 1990년대 중반 10% 정도에서 2000년대 20%대로 올라갔고 2007~2009년에는 3년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건설업, 철강업,조선업, 해운업, 금융업 등 주요 산업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급랭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과거 이 업종의 대부분의 기업과 경영진들은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에서는 좋은 시절이 오면 모든 것을 안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산업의 부침은 세계적인 기업도 피해가지 못했다. 코닥의 필름, 노키아의 휴대폰, 델의 PC 등 수많은 기업이 제품과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는데도 기존 전략을 고수하다 몰락했다.
노키아는 피처 폰 성공에 취해 스마트 폰이라는 시장 변화의 불확실하고 달갑지 않은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는 처음에는 블랙베리, 다음에는 삼성과 애플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다. 델의 경영진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좀 더 싼 가격에 PC를 공급받기 원하며 노트북처럼 비싼 제품은 시기상조라는 믿었다가 추락했다. 소니는 TV가 브라운관에서 평판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2000년대 초반까지 브라운관 개량에 집중하다가 무너졌다. 필름 시장 최강자였던 코닥은 디지털 시장에 적응하지 못해 파산했다.
짐 콜린스(Jim Collins)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How the mighty falls)』에서 ‘위대한’ 기업들은 정점에 올랐을 때 경영상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어찌보면 기이하게 ‘변하지 않는’ 진실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것은 확실하듯이 경기가 좋으면 나빠지고 산업이 호황이면 언젠가는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확실하다. 태어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정체되고 늙어서 죽는 것이 생명체의 운명이다. 기업도 생명체와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제품이나 그 기업 자체 그리고 산업은 도입기(창업초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린다. 제품이든 기업이든 산업이든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고 기업은 위기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기업실적과 산업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시간이 흐르면 다시 나빠지는 것은 해가 뜬 후에 해가 지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좋고 성장이 지속되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특히 경기가 좋고 산업이 호황일 때 지나치게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과 투자는 경기가 나빠지고 산업이 후퇴하면 순식간에 부실기업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도산한다. 우리는 이를 ‘과거 환상’, ‘과거 리스크’라고 부를 수 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이다. 과거 실적에 만족하다가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경영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안주(安住)의 위험
진정한 등반가는 산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등반사고는 늘 정상을 밟고 하산할 때 발생한다. 방심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돌아오지 않는 길(죽음)이 기다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기업이 높은 이익을 내고 성장을 지속하면 자만심이 하늘을 찌른다. 그 성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확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도평가하게 된다. 타성(Inertia)에 젖은 경영은 현재의 경영 상태에 만족해 변화와 도전을 주저하고 경쟁 우위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우다. ‘넉넉할 때 흉년에 대비한다.’는 속담은 여기에 딱 맞는 말이다.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나?』에서 기업이 망하는 1단계를 ‘성공에서 자만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하여 성장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의 가치나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더 이상 고성장이나 고수익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기업경영진들은 높은 시장가치와 그동안 달성한 수익성 및 성장성에 안주하게 된다. 기업이 설정한 전략은 기업이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지만 시간이 지나 환경이 변하면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산업과 환경이 변하는데 기존 전략을 고수하여 변화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기업이 현재의 성과에 도취되거나 기존전략에 매달리는 경우 닥쳐올지도 모를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거나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기업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대응의 전략
불확실성 예의주시
기업의 경영환경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2000년대 초반에는 21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5대
자동차 회사만이 살아남을 거라는 Big5 생존대세론이 널리 수용되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을수는 있지만 기업한경은 늘 변한다. GM과 포드는 이 예측이 확실하다고 전제하고 기업인수에 나섰다가 무너졌다. 미래는 늘 불확실하며 예측이란 틀릴수 있으며 확실한 미래는 없다. 초우량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온다.
미래는 예측이 어렵고 늘 변화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
가 있다. 하나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신이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There are two kinds of forecasters: the ones who don’t know and the ones who don’t know they don’t know. John Kenneth Galbraith).”라고 까지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단지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앞서갈 수만 있다.
변화를 경영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일환으로 삼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One cannot manage change. One can only be ahead of it…Unless it is seen as the task of the organization to lead change, the organization will not survive. Peter Drucker).
기업의 실패는 경제적 위기 국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려면 그 불확실성을 알아야 한다. 우선 환경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CEO들은 일상 업무에만 매달리면 안 되며 기업과산업의 동향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늘 예의주시 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고 한가한 시간을 만들어 늘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과거로부터의 탈피
기업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기업이 현재 전성기를 맞고 있다면 그것은 회사의 위기의 시작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때 성공한 기업과 계속적으로 실적을 내는 우량기업의 차이는 첫 번째 성공을 운으로 돌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래를 새로이 준비를 하느냐의 차이이다. 과거 성공요인이 현재나 미래의 패배요인이 된다는 것은 검증된 이론이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상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했던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고집을 피우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실패한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살아남는 종은 강인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선택’되어 살아남는다. 가장 크고 강력했던 공룡은 멸종했다. 기업과 경제에도 진화론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강자인 초우량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기업과 산업의 성장 사이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역사속으로 사라진 기업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 실패에 대한 걱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생명과 기업이라는 유기체의 현실이다.칼 마르크스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어 기존 산업이 도태되며 그 변화는 기업의 생사의 문제가 된다고 예측했으며, 지속적인 혁신없이는 기업은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The bourgeoisie cannot exist without constantly revolutionizing…).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았다(Constant revolutionizing of roduction,uninterrupted disturbance of all social conditions,everlasting uncertainty and agitation distinguish th bourgeois epoch from all earlier ones).
과거와 현재의 성공 그리고 경쟁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다. 과거를 잊고 도도히 진
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과감하게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추진한 기업과 경영자가 드물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성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시아드(INSEAD)의 이브 도즈(Yves Doz) 교수는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업들이 핵심역량에만 집중하다 보면 망하기 십상이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핵심역량이론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가 한 곳만 바라보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역량 이론은 1990년대 혼다와 캐논 등의 일본 회사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으로 핵심 분야에 집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21세기는 기업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분야만 집중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한 방향으로 자동차를 몰면 시야가 좁아지고 앞만 보게 되는 것과 같아 옆과 뒤에서 닥치는 장애물을 피하지 못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은 다르다. 앞만 보고 한길을 달리다보면 갑자기 낭떠러지의 나락으로 주저앉는 ‘승리의 저주(the curse of success)’라는 함정에 빠진다.
노키아 휴대폰은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기업몰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업이 전략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변수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은 중요하다. 기업의 유연성은 기업전략을 세울 때 가정했던 전제조건이 변했을 때 유연하게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역동적이고 이젠 기업의 전략은 변화의 전쟁(war of movement)이다. 한 기업의 경쟁력은 쉽게 모방되고 일시적이다.
전략적 방향의 설정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써 경쟁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시기를 노린다. 이것이 재산 증식의 대강이다.” 사마천의 말이다. 그만큼 시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하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first mover)은 성공했을 경우 선두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그 대가가 크다. 반면 선도 기업이 진입한 이후 신속한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도 있다. 병행전략(parallelmover)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진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전략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그것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병행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형 차에 대한 전략으로 전기 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를 병행해서 투자하고 있다.세계 자동차시장은 어떤 차가 어떻게 시장에서 성장을 주도할지 미궁에 빠져 있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시장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먼저 변하는 기업이 성공하며 단지 모방하는 기업은 어렵다. 기업의 성쇠는 변화하는 시장과 변화하는 고객니즈에 부응하는 것에 달려있다. 성공적인 기업은 훨씬 빠르게 제품, 시장 그리고 사업자체까지도 새로이 도입하거나 철수한다.
기업은 인간이나 생명과는 달리 환경에 적응하여 점차적으로 진화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진화의 시점이 더 중요하다. 생명의 진화와 같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때로는 환경변화보다 앞서서 더 나아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아모레퍼시픽은 경쟁력이 있는 화장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여 1991년 태평양증권, 패션 부문, 상호신용금고를 매각했다. 어떤 전략적 지향을 가질지 기업과 기업가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현재의 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 기업이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살아남고 성공하
려면 경쟁력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transforming the basis of competition), 환경의
변환에 따라 경쟁상의 우위를 창조하거나 강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600여 개 상장기업의 평균 순이익률은 설립초기인 10년 미만 시기에는 5.9%로 가장 높지만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된 기업이 3.4%로 가장 낮고 그 이후 30~40년부터 3.7%로 반등하였다.
기업은 창업 후 20~30년이 위험한 시기이고 기업의 장기적 생존의 갈림길이며 이 시기를 극복하면 장수기업으로 수익을 달성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강화하여 장수기업으로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지 변신을 시도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시장이 포화되면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M&A와 통합은 필연적인 전략이다. 반대로 제품과 시장을 니치시장으로 전환하여 전문화하는 방법도 있다.
 |
| ▲김근수 공인회계사 |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기업의 위기관리는 일상적인 상황이다. 선제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불황 장기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자산과 사업을 매각하고 단기적인 부채의 장기 전환 등의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만일 대비한 보수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더 넓고 멀리 내다보는 관점이 요구된다. 늘 최악의 환경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기업가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차입은 양날의 칼(doubled-edged sword)이라는 점이다. 경기가 좋고 기업이 성장할 때는 차입투자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경기나 나쁘고 기업실적이 부진해지면 바로 부도로 이어지는 부담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차입금은 피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차입은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침은 늘 리스크를 수반하기 마련이다.『구약성서』, 「잠언」(22.7.)을 보면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고 말한다. 차입은 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파산으로 치닫게 하는 악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장수기업들은 상당수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글/ 김근수 공인회계사, (주)글로벌 M&A & 글로벌컨설팅 어카운팅 대표>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