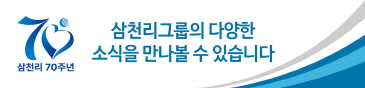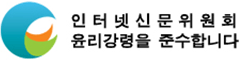[에세이가 있는 삶] 김희철의 '틈'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1-22 07:53:27
 “죄송합니다. 어떻게 손목 부분이라도 살려보려 했지만, 잘린 게 아니라 으스러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척골과 요골은 다치지 않아서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크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손목 부분이라도 살려보려 했지만, 잘린 게 아니라 으스러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척골과 요골은 다치지 않아서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크지 않을 겁니다.”
수술을 끝마치고 나온 의사의 말이었다. 미숙은 눈물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로 의사를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온 남편의 손을 본 순간 의사가 말을 얼마나 에둘렀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왼쪽손을 손목에서 싹둑 잘라 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었다.
십 년을 하루 같이 수족처럼 부리던 기계에 손을 집어넣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숙의 남편 김광진 씨는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일했다. 비록 막노동에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미곡 운반 차량에 쌀 포대를 올려주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을 들이 밀만큼 어리석거나 틈새를 보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눈깜작할 사이에 안전덮개의 헐거워진 틈으로 옷소매가 딸려 들어가 버렸고 그의 비명소리를 들은 동료 정 씨가 달려들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렀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인가. 비상 안전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허겁지겁 전원 스위치를 내렸을 때는 이미 김 씨의 손은 벨트와 풀리 사이를 통과해 으스러진 뒤였다. 병실로 옮겨진 김 씨는 피를 많이 흘려선지 얼굴이 백짓장이었다. 손이 있던 자리만 멍하니 내려다 볼 뿐이었다. 마취가 풀려 통증이 시작되었어도 김 씨는 눈가를 가끔씩 씰룩거릴 뿐 이도 악물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이 위안을 오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문병을 와도 그저 먼 산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다.
“여보, 나는 당신 보고 살았지, 당신 왼손 보고 살지 않았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입에 발린 듯한 아내의 위로에도 김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의료보험 공단, 경찰서, 노동청, 보험회사, 국민 연금관리 공단, 회사 자체 감사실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병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김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 아니오 정도였다. 그래선지 뭔가 일이 단단히 꼬이고 있었다.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미곡처리장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광진 씨가 워낙 성실하고 몸을 아끼지 않아서 지금까지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아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치료비와 보상금, 연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제 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라뇨?”
미숙은 늙수그레한 노무사의 이마에 겹겹이 들어선 주름을 보았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씨가 타게 될 보험료가 상당합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보험금을 노리고 수족을 절단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세상에! 여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씨는 아내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무사의 입만을 지켜볼 뿐이었다.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직장 놓치고, 장애인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곡처리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벼수매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랬다. 예전처럼 농부들이 벼를 말려 가마에 담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콤바인에 벼를 베어 낱알을 훑어 쏟아내면 트럭에 실어 곧바로 미곡 처리장으로 와 트럭 째 무게를 달았다. 벼를 쏟아낸 다음 다시 빈 트럭의 무게를 달아 벼의 무게를 측정하고 일정량의 수분 비율을 빼낸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이 이른바 ‘물벼 수매’였다. 농가는 물론 미곡처리장에서도 일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노무사는 그늘진 얼굴로 말을 이었다.
“올해에도 한 사람은 그만둬야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광진 씨가 사고를 당했으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일 안 해도 월급 나오는 평생직장 잡았다고 쑥덕대는 사람들이 있는 판이니까요. 요즘같이 직장잡기 힘든 세상에 말입니다. 더구나 공부 잘하는 아들딸이 곧 대학을 갈 터인데 그 학비를 어이댈까 걱정하는 광진 씨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오해를 살만도 하지요.”
“당신! 뭐라고 말 좀 해 봐요!” 미숙은 남편을 다그쳤다.
“여보.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까짓 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일은…….” 미숙은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여보! 제발 그만. 더 이상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 씨는 다시금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미숙은 소름이 돋아나 남편에게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다. 속부터 벌벌 떨리기 시작한 미숙은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못했다. 김 씨도 경찰관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눈길을 허공으로 돌리고 있었다.
“김광진 씨.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무조건 입만 다문다고 진실이 덮어질 줄 아셨습니까? 비상 정지 장치의 릴레이 핀과 안전 덮개의 나사못이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어설픈 자작극이었습니다.”
미숙은 뒷골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았다. 경찰관이 병실 문을 향해 손짓을 했다. 병실에 몇 번 오간 낯익은 형사가 들어섰다. 이대로 남편이 잡혀가는걸까? 미숙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목이 잠겨 말을 내보낼 수가 없었다.
 |
| ▲ 김희철 동화작가 |
형사의 뒤를 따라 남편의 직장 동료 정 씨가 어정쩡하게 들어서고 있었다. 정 씨가 증인이구나! 형사가 정씨를 김 씨 앞으로 밀쳐냈다. 정 씨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가쁜숨을 내뱉고 있었다.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김 씨가 다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연히 자신의 자리가 보전되리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릴레이 핀과 안전 덮개를 부순 것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먼저 끌 수도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비상 정지 스위치를 여러 번 눌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수상한 점을 보아 수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물러가자 김 씨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아내의 뒤통수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바보 같은 놈. 기왕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입을 다물 것이지 틈을 보이다니. 아내와 애새끼들은 어찌 살라고! 여보. 나는 벌써 짐작하고 있었어. 아침마다 사용하는 기계를 점검하는 걸 잊지 않았어.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날도 나는 컨베이어 벨트를 확실하게 살펴보았어.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가 점검을 끝낸 후에 기계를 만진 거야. 내가 다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여, 여보. 그런데도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쳐든 미숙이 물었다.
“기왕에 나는 다쳤고, 직장을 잃었어. 이 마당에 또 한 명의 실직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 얼마나 힘들게 버텨온 직장인데…….” <글/ 김희철 동화작가>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